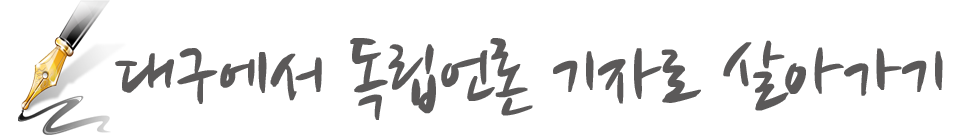2년째 코로나19 취재를 하다보니, ‘쓸데없는’ 고민만 느는 것 같다.
어제부터 정부가 고위험군을 제외한 코로나19 확진자(일반관리군)에 대해선 특별한 관리 없이 필요한 경우에 스스로 관련 기관을 통해 치료·상담받을 수 있는 방안을 실시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언론에서 ‘셀프 재택치료’ 난맥상을 짚는 보도를 쏟아냈다. 난맥상의 핵심은 준비 부족이다. 일반관리군이 필요한 경우 치료·상담 받을 수 있는 동네 병의원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고, 알려진 병의원은 준비가 충분하지 않고,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2년 전 코로나19가 처음 발병한 후부터 줄곧 정부의 대응이란 게 이런 식이다. 계획을 발표하지만 현장에선 여러 이유로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 제일 밑에서 환자를 직접 만나고 쳐내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허덕이는데, 책상머리에 앉은 이들은 숫자로, 방역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중앙 정부든 대구든 마찬가지다. 그들은 그들의 일만(숫자를 정하는 일만)하고 현실(숫자가 현실화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듯 보인다.
재택치료 문제도 그렇다. 이미 지난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할 때 재택치료는 주요한 방역체계의 일환으로 준비됐다. 재택치료를 전면 도입한다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입원 여력의 부족에만 있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일상회복으로 가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코로나19를 일상의 의료시스템으로 가져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통상적인 독감 환자들이 그러는 것처럼 아프면 동네 병원가서 주사 맞고 약 받아먹으면서 하루 이틀 푹 쉴 수 있는 구조 같은 것 말이다.

물론1, 코로나19가 여타 독감보다 더 치명적이라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코로나19 환자를 구분하고 감염 전파 위험을 낮추는 체계를 병의원이 갖추도록 해야 했다. 이건 단순히 이번만을 위해 필요한 준비는 아니었다. 코로나19 이후 주기적으로 찾아올 감염병을 대비한 체계를 이제 우리 의료체계 전반에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그때부터 마련해왔다면 지금은 달랐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이유다.
물론2, 의료체계만 준비해서 일상의 회복이 가능한 것도 아니다. 시민들이 2년간 내재해온 공포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의료체계가 준비된다고 해도 시민의 수용성이 낮으면 무소용이다. 수용성을 높이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공포일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공포는, 불확실성에서 나온다. 모르기 때문에 무섭다. 병에 대해 아는 것 뿐 아니라, 의료체계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내가 아프면 어디서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는지까지 다방면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
여기에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언론은 공포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특히나 요즘같은 시국에는 더더욱 그렇다. 문제는 언론인도 개개별로 방역체계에 대한 이해도에 차이가 있고, 언론사별로, 개인별로 현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차도 있다.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이해한 만큼만 쓴다.
그래서, 어렵다. 무작정 정부를 비판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보이고, 그들도 나도 해야 할 일은 많고, 하루 아침에 뚝딱 될 일이 아니라는 것도 그렇고, 열심히 쓴다고 한들 누가 또 읽겠나 싶어서 그렇고… 이래저래 고민은 늘고 머리만 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