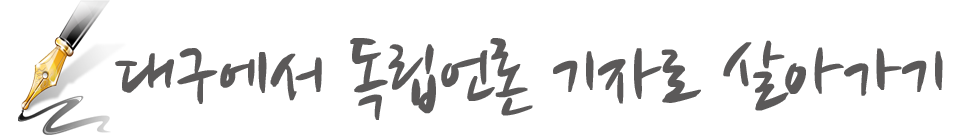마음이 급했다. 공공주택사업지구 바로 옆에 땅을 사둔 시의원을 확인하고 그 땅을 둘러보고 오는 길이었다. 언제 허물어져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허름한 건물이 그 땅 위에 남아 있었다. 주변을 돌며 부동산 업자들에게 동향과 의견을 구하고, 차로 가는데 배가 고팠다. 아침을 먹고 나왔지만, 급하게 움직인 탓인지 주린 배가 점심시간을 그냥 넘기지 못하는 듯했다. 오후 2시로 예정된 일정이 있고,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식당으로 찾아들 여유는 없었다. 급한 대로 편의점으로 가 바나나우유를 집어 들고, 삼각김밥도 한 개 집었다. 시간이 없을 때 종종 먹는 식단이다.
예정된 일정을 맞추려면 시간은 빠듯했다. 일정을 마치면 방금 확인한 걸 토대로 기사도 써야 했다. 마음도 급해졌다. 급한 마음으로 차를 몰았지만, 붉은 불빛을 마음대로 푸른색으로 바꿀 순 없는 노릇이었다. 가다 서다를 반복하다가 아무렇게나 돌린 시선에 분홍빛 가로수가 들었다. 어김없이 찾아온 봄이 거기 있었다. 감염병이 창궐하던 지난해 3월 이 무렵에도 그랬다. 봄은 소리소문없이, 저렇게 분홍빛 꽃으로, 종잡을 수 없는 일교차로 찾아왔다. 붉은 신호등과 분홍꽃을 번갈아 쳐다보다가, 차선을 바꿨다. 꽃나무 아래 산책 대신 아쉬운 대로 꽃나무 아래 주행을 하기로 했다. 잠시 잠깐의 꽃놀이로, 뒤늦게 확인한 봄과 인사했다.

***
심리적 여유가 없는 몇 년을 보냈다. 기사 외에 변변한 글을 쓰는 것도 힘들어졌다. 글을 읽는 것도 피곤한 일이 됐다. 글을 쓴다는 건 필연적으로 ‘생각’을 동반하는 일인데, 그게 싫었다. 생각을 하는 게. 더구나 요즘은 잘 쓰여진 글 보단, 잘 꾸며진 사진이나 영상이 더 소구력 있는 시절이기도 했다. 글을 쓰는 건 아무래도 가성비 없는 일로 느껴졌다. 이래저래 글을 쓸 이유는 생기지 않고, 쓰지 않아도 될 이유만 늘었다. 봄꽃을 보고, 봄과 인사하던 그날에도 무엇보다 먼저 휴대폰을 꺼내들고 거치대에 올린 채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누르는 걸 먼저했다.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이부자리에 누운 채 그렇게 찍힌 영상을 다듬어 SNS에 공유하면 그걸로 끝.
그런데 끝, 이면 안 될 것 같다. 뒤늦게 확인한 봄을 보고 잠시 잠깐 여유를 가졌던 것처럼, 일상에 여유를 가져오기 위해서라도 글을 써야 할 것 같다. 일이 아니라 삶을 위해. 일주일 중 6일은 바쁘게 일을 하더라도, 하루는 여유롭게 삶을 살기 위해. 지난 6일을 되달아보는 차원에서라도 글을 써야할 것 같다. 어떤 형식이든, 무엇이 되었든. 잘 쓴 글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써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