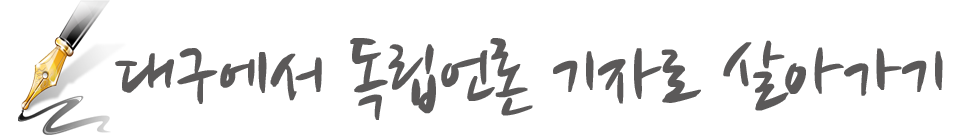한국 생활 11년째, 네팔 이주노동자 로미 씨를 만나다
내 이름은 로미. 본명은 아니다. 본명을 알려줄 순 없다. 그렇다. 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다. 본명을 알려줘도 한 번도 제대로 된 이름으로 불린 적은 없다. 처음 일했던 직장에서부터 경리를 보던 여직원이 내 이름을 바꿔 불렀다. 발음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등록이 되어 있을 때도, 미등록이 되어서도 나는 제대로 된 이름으로 불린 적이 없다.
혼란스러웠던 조국… 마오주의자들의 위협 속에 한국으로
나는 네팔에서 왔다. 중국과 인도 사이에 가로로 길게 뻗어 있는 나라다. 1974년, 나는 네팔 서극단에 자리 잡은 도티(Doti)에서 태어났다. 도티는 수도 카트만두(Kathmandu)에서 서쪽으로 산길을 돌아 1000km, 길이 끝나는 곳에 있다. 지역의 66%가 산림지대인 그곳은 풍부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가 거의 없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 대부분은 농사를 지으며 살아간다.
고향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다. 내 나이 다섯 살이 되던 해 가족이 카트만두로 이사했기 때문이다. 내 교육을 위해서였다. 네팔에서는 다섯 살부터 초등 교육을 받는다. 교육열이 높은 편이지만 카스트 제도의 영향으로 여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집안 형편에 따라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도 많은 편이다. 평균적으로 절반 정도의 아이들이 학교 교육을 받는다. 아버지는 장사를 했고, 그렇게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집안 형편을 유지했다. 대학까지 공부를 마쳤고, 대학에서 아내를 만났다.
대학을 다니던 1990년대 초반 네팔은 한국의 80년대 후반과 비슷한 형국이었다. 당시 네팔은 1769년부터 지속된 샤 왕조의 왕정 국가였다. 샤 왕조는 2008년 왕정이 폐지될 때까지 존속했다. 1990년대 초반은 비렌드라 국왕의 통치기였는데, 전대 마헨드라 국왕 때부터 이어진 전제군주체제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던 상황이었다. 때문에 1990년 2월, 국민운동이라 불리는 대규모 저항운동이 일어났다. 결국 4월 비렌드라 국왕은 정당정치와 의회민주주의를 수용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이듬해 총선거를 치러 내각을 구성했다.
안정을 찾아가던 정국은 1994년 선거를 통해 제1당이 되었던 네팔공산당이 보수연합 정부에 정권을 내주게 되면서 다시 혼란스러워졌다. 1996년 마오주의자(Maoist)들은 인민전쟁을 선포했고 내전이 시작되었다. 그즈음 나는 군대를 다녀와 왕궁을 지키는 경호원이 되어 있었다. 그때부턴 끊임없는 위협의 연속이었다. 집으로 마오주의자들의 협박 편지가 날아왔다. 정부는 경호원의 안위를 지켜줄 만큼 안정적이지 못했다. 자구책을 찾아야 했다. 마오주의자들의 위협 속에서 2002년 한국행을 결정하게 되었다. 두 살밖에 되지 않은 딸을 뒤로 한 채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낯선 이국땅, 성서공단노조를 만나고
2002년 4월 13일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다.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가장 쉽고 빠르게 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한국은 1993년에 도입한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로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노동자를 국내 기술 이전이라는 명목으로 끌어 모으고 있었다. 이후 고용허가제로 제도가 전환되어 8년을 맞은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추산 48만 5천명(2012년 5월)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 대략 2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나와 같은 미등록 노동자를 포함하면 70만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
첫 직장은 대구 성서공단의 섬유공장이었다. 한 달 동안 야간, 주간 가리지 않고 일해서 받은 돈이 70만원이었다. 최저임금이 2,275원이던 시절이었다. 아무리 계산해도 100만원 정도는 받아야 하는데 임금은 턱없이 부족했다. 사무실로 찾아가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도 말이 통하지 않았다. 오케이, 오케이. 그걸로 끝이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이국땅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었다. 그저 묵묵히 일 할 수밖에.
2005년 초, 장을 보러 나갔다가 우연히 성서공단노조를 알게 되었다. 망설임 없이 노조 사무실을 찾아갔다. 임금 문제를 상담했다. 노조 상근자들은 어림잡아 300만원 정도는 더 받아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싸워야 한다고도 했다. 말이 통하지 않아 두려웠지만 싸워보기로 했다. 노조와 함께 문제제기를 시작해서 6일 만에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때부터 주말이면 노조 사무실로 ‘출근’을 했다. 노조 상근자들은 한국의 이주노동자 제도의 문제점를 이것저것 알려줬다. 나처럼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노동자의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성서공단노조와 인연을 맺고 있다. 성서공단노조 부위원장이라는 직책까지 맡게 되었다. 나와 비슷한 처지의 이주노동자들이 매 주말이면 노조 사무실을 찾아온다. 임금체불, 사업장 변경 등의 문제로 찾아와 상담을 하곤 한다. 한 가지 아쉬운 건 그들이 스스로 나설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다. 도움만 요청할 뿐 스스로 무언가 하기를 주저한다. 이해는 한다. 가족을 위해 돈을 벌려고 한국에 왔으니, 노조 활동을 하다가 직장을 잃으면 안 될 일이다. 하지만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다.

네팔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주노조)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탄압은 가혹하다. 그러니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2005년 4월에 결성된 이주노조는 지금까지 4명의 노조 위원장이 있었지만 모두 강제퇴거 조치당했다. 나 또한 단속과 강제퇴거로 이어지는 노조탄압의 위험에서 자유롭진 못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 운동을 멈출 순 없다. 우리 이주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그만큼 처절하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들의 처절한 사례는 여기저기에 널려있다. 나는 지금까지 다섯 곳의 사업장에서 일 했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곳은 2010년, 4개월 동안 일했던 화학약품 공장이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까지 일하면 밤새도록 술에 취한 것처럼 몽롱했다. 작업장에서는 보호장구도 주지 않았다. 같은 일을 하는 한국인 노동자는 보호장구가 있었지만 내겐 마스크조차도 주어지지 않았다. 그저 “괜찮아. 괜찮아”라는 말 뿐이었다. 보호장구 지급을 요구하며 회사와 싸웠다. 4개월 만에 회사는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대신 나를 해고했다.
지금 일하는 곳은 현대중공업의 하청업체다. 사장을 포함한 직원이 세 명이다. 나머지 한명도 나와 같은 네팔 이주노동자다. 세 명이 2교대로 주야로 일한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간 업무는 혼자서 본다. 엔진 링을 가공하는 기계 3대를 혼자서 봐야 한다. 70kg에 달하는 철제를 혼자서 든다. 일이 힘들어서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다. 사장은 내가 노조 간부라는 것도 알고 미등록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이것이 내가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위협 속에서, 이제는 열 두 살이 된 딸이 보고 싶어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다. 고향 생각, 가족 생각에 흔들릴 때도 많지만 그럴 때마다 떠오르는 건 우리들이 처해있는 현실이다. 한국의 고용허가제가 올해로 시행 8년째를 맞았다. 나는 그 8년을 온전히 한국에서 보냈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자가 아닌 노예로 굴종의 시간을 보내는 세월이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제도는 굳건하고, 오히려 더 가혹해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아직 이곳을 떠날 수 없다.
이상원, 천용길 기자 solee412@newsmin.co.kr
ⓒ 뉴스민 (http://www.newsmi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